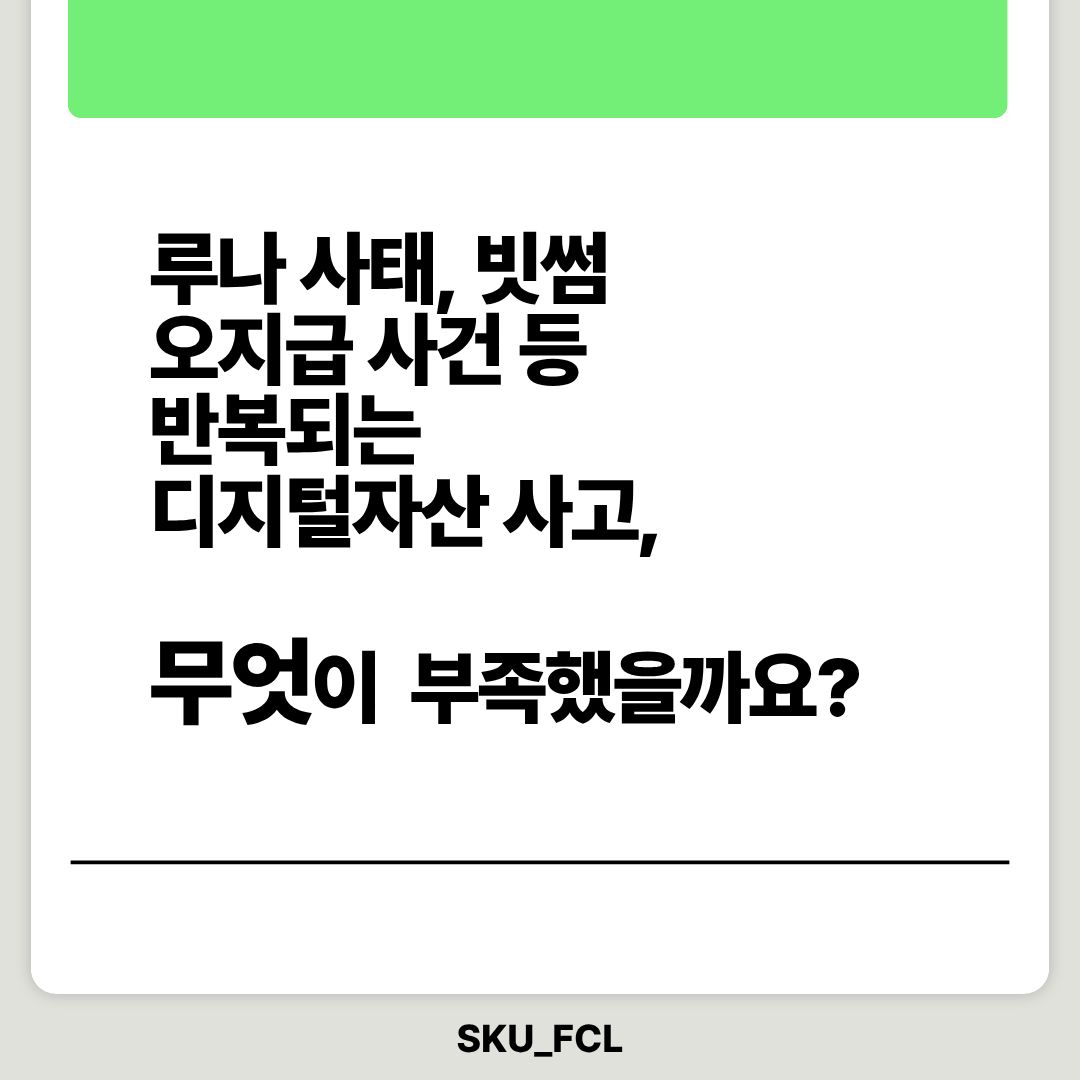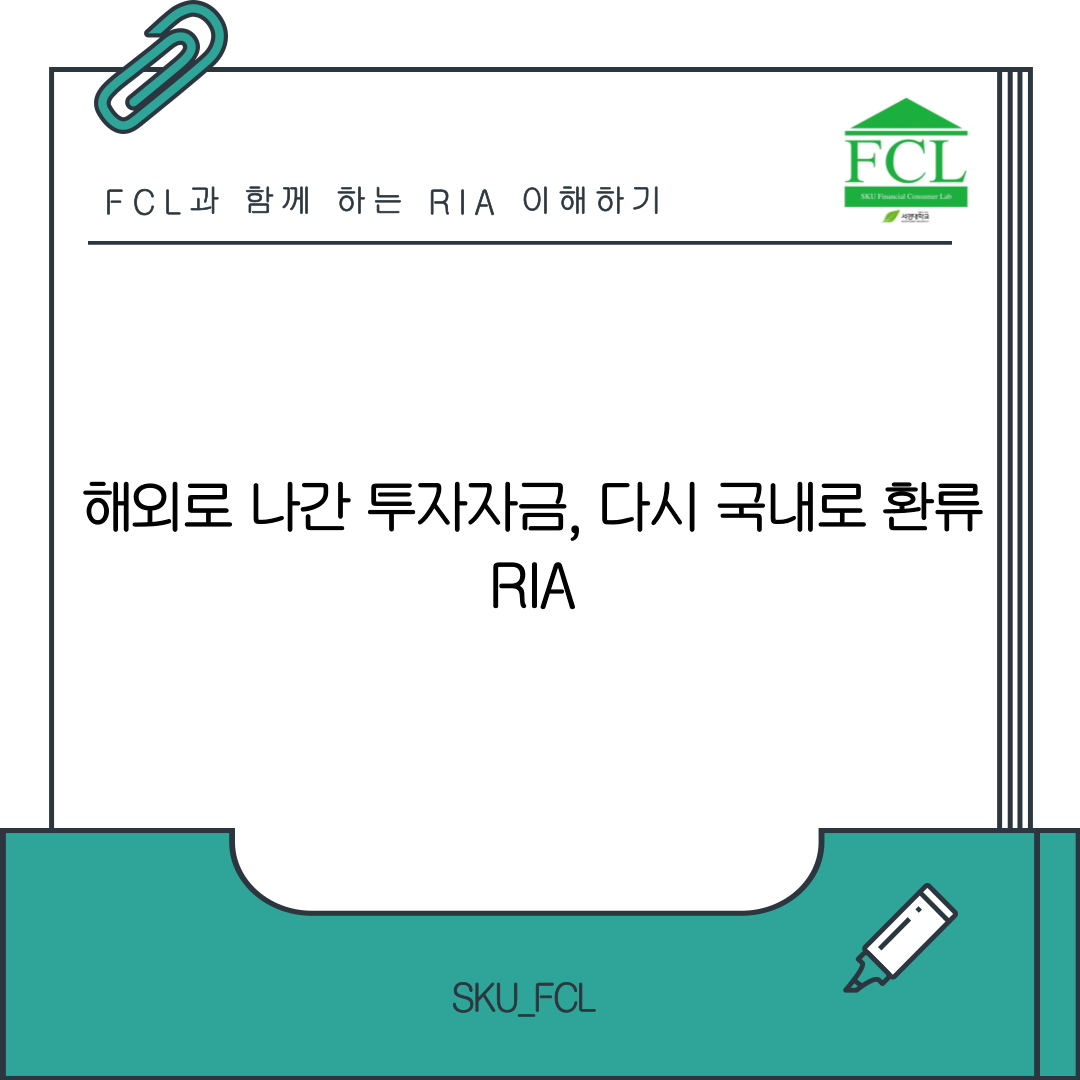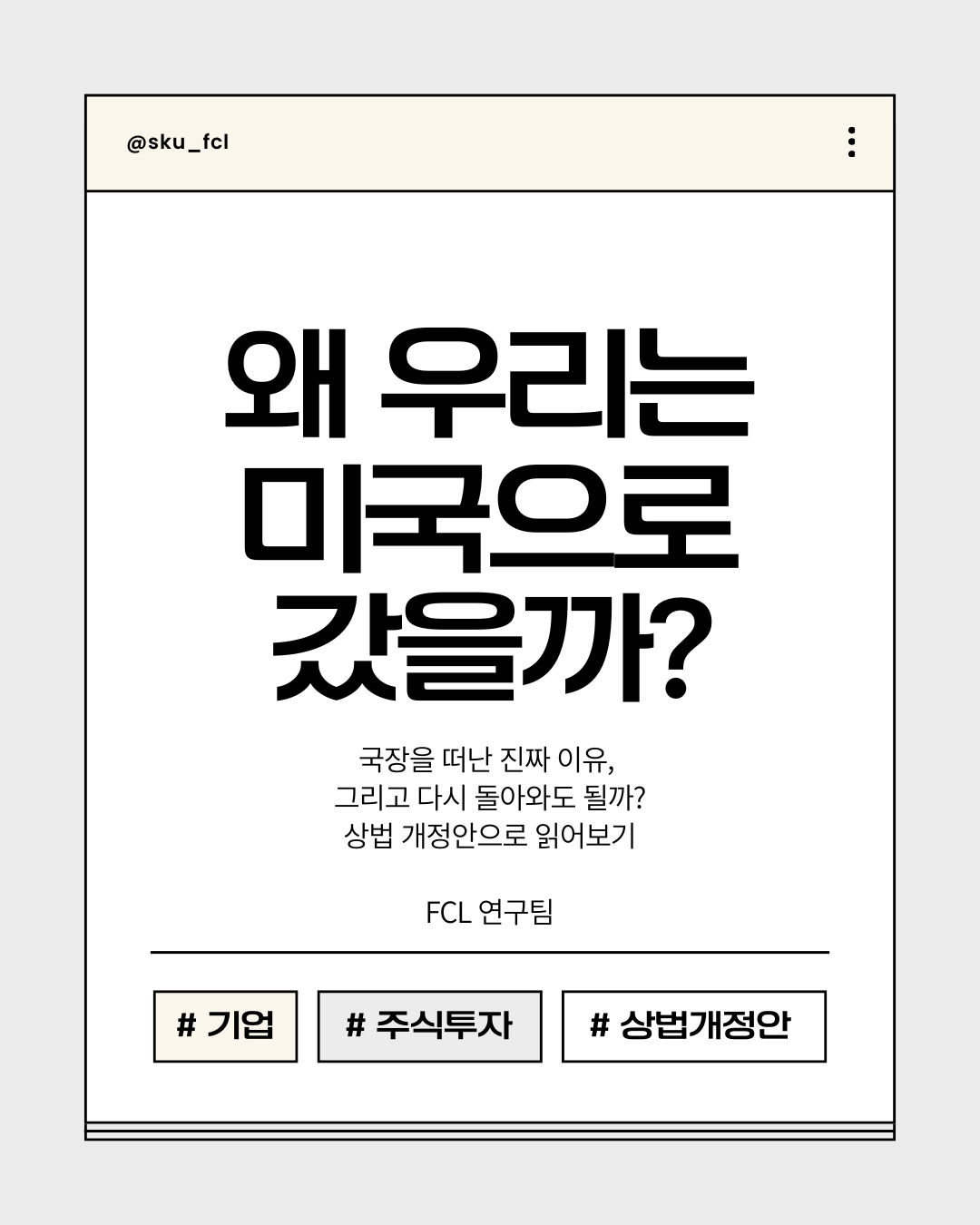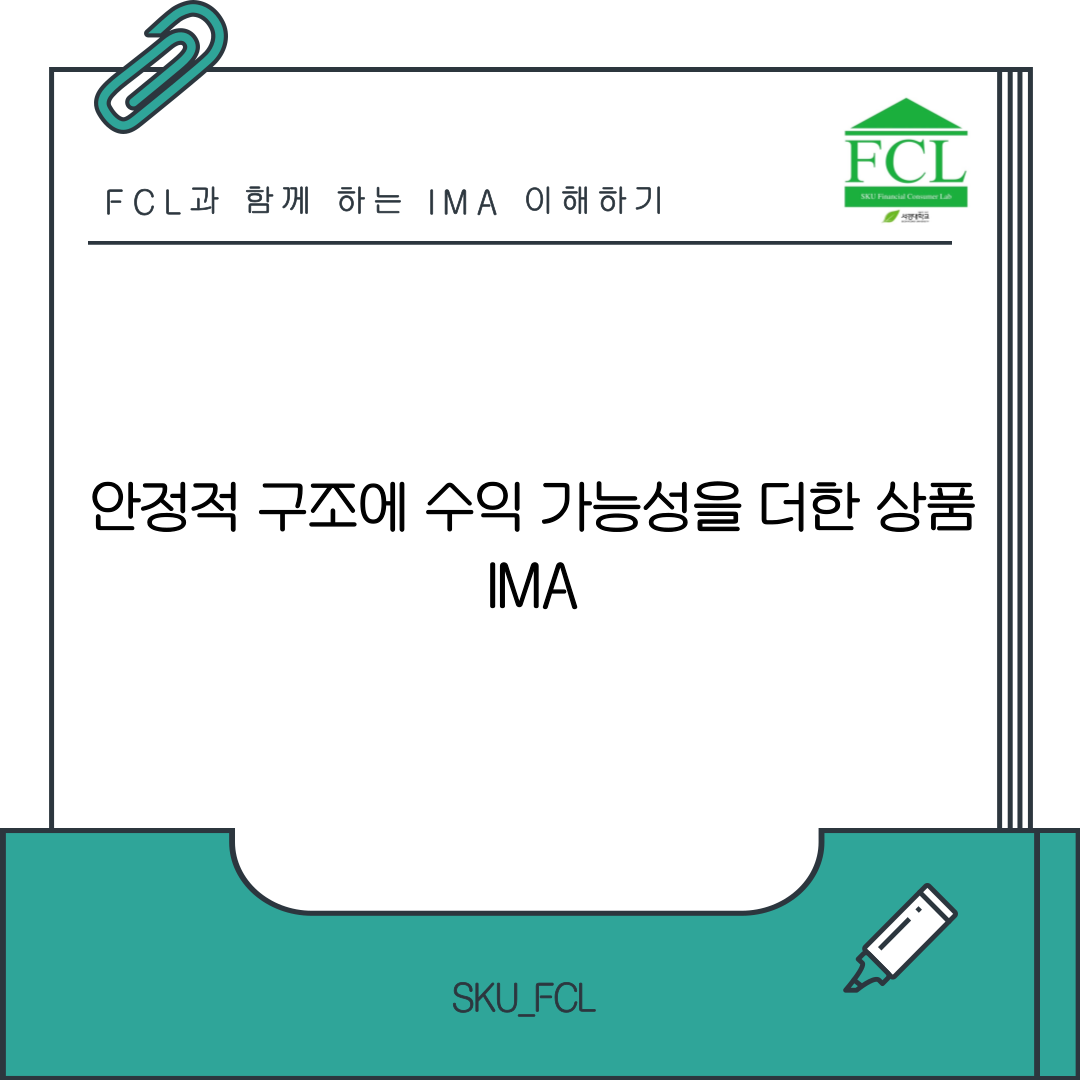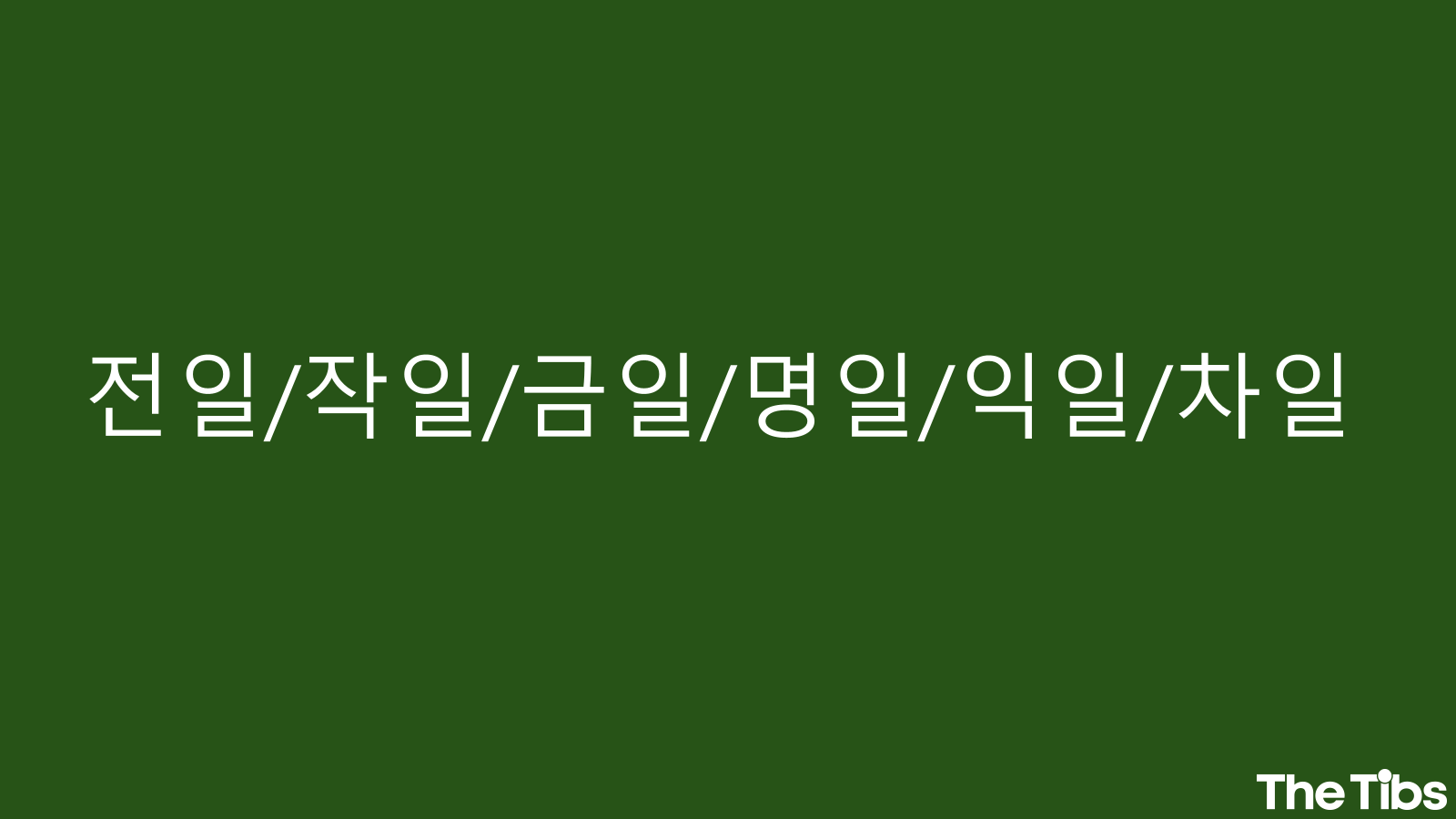조혜민의 거스러미
손가락 끝에 붙어 자꾸만 신경쓰이는 거스러미처럼, 조금 불편하거나 따가울지도 모르지만 갈수록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그냥 지나치면 안될 이야기를 전합니다.
2020년,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놀랍게도, 가해자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강박적이고 집착적인 행동을 일삼아 괴롭히며 피해를 주는 게 스토킹인데 만나지 않고도 피해를 경험하는 게 가능한지 물을 수도 있겠다. 씁쓸하지만 가능했다. 가해자는 나를 휴대폰 하나로 감시하고 옭아매고, 나의 일상에 침범했다.
시작은 페미니즘 정치운동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모인 카톡방이었다. 내가 한 정당에서 대변인 활동을 할 때였다. 나는 정치 활동에서 페미니스트 아젠다를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활동했고,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그 사람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따로 보내왔고, 나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스토킹이 시작됐다.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을 하지 못한 어느 날, 그에게 메시지가 왔다. “방금 사무실 앞에서 우연히 네 얼굴을 봐서 참 좋았다”고 했다. 오해라고 넘기면서도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았다. 불쾌함보단 두려움이 컸다. ‘집 밖을 나가도 될지’ 무서워서 손이 덜덜 떨렸다. 어떤 답도 할 수가 없었다. 얼마 뒤, 같은 정당의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다. 한 남성이 동료가 일하는 사무실로 연락해 나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끊었다고 했다. 번호를 확인했더니 같은 사람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비슷한 연락이 이어졌다. 반응이 없으니 다른 식으로 연락해오기 시작했다. 회사에 내 이름으로 연이어 택배를 보내왔던 것이다. 당시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러 여성단체가 후원금 모집을 위해 펀딩을 하면 후원 물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데, 택배들은 모두 펀딩 물품이었다. 후원 물품을 보낸 단체에 문의하니 내 이름으로 펀딩에 참여한 사람은 전부 그 사람이었다.
얼굴 없는 스토킹 가해자, 벌벌 떨던 3개월
단호해질 필요가 있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안하고 무서웠다.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 또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웠다. 나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며 내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바로 가해자를 차단했다. 그러나 아랑곳없이 가해자는 다른 번호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그 사람은 마치 내가 자신의 연인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며 계속해서 수십만원의 돈을 송금했다. 메신저 속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은 ATM 기기였다. 손이 다시 한번 덜덜 떨렸다. 나는 그만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3개월에 걸쳐 내게 벌어진 이 스토킹은 평온했던 내 일상을 크게 흔들었다. 단순한 두려움뿐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던 업무에도 안좋은 영향을 미쳤다. 정당 대변인으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일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전과 달리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받기 어려워졌다. 집에 오는 길에도 혹시나 그 사람이 나를 어디선가 보고 있진 않을까 두려웠다. 업무를 위한 여러 행사 자리에 다니면서도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게 됐다.
물론 집으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도 아니니 무시하면 그만이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직접 만나지 않고도 휴대폰 하나로 나를 지켜보고, 감시하고, 내 삶에 개입하고, 자신과 내 관계를 거짓말로 꾸며내는 등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이미 벌어진 일뿐만 아니라,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스토커가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두려웠다. 인간관계, 업무, 경제활동 등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한한 인터넷 세상 속에서 그가 내가 모르는 어떤 짓을 하는지 다 알 수 없다는 공포가 더욱 컸다.
여기에 나를 괴롭힌 게 또 하나 있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과 보이지 않는 감시에 너무나 괴롭고 두려웠는데도, 스스로를 검열하곤 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게 뭐야?” “물리적 폭력을 당한 적도 없는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주변에 고통을 털어내지도 못한 채 끙끙 앓았다. 경찰 신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두 번을 차단하고 나서야 그 사람은 더이상 접촉해오지 않았다. 물론, ‘내가 알기론’ 말이다.
아주 오래된 폭력의 새로운 얼굴일 뿐
내가 이 경험을 ‘스토킹’, 그리고 그를 ‘가해자’로 명확하게 부르며 내 이야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건, 스토킹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나서였다. 나와 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슬프게도 참 많았다. 그리고 나서야 분명히 알게 됐다. 내가 겪은 일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젠더폭력 그 자체라는 걸. 그 폭력이 기술이라는 새 옷을 입은 것 뿐이라는 것. 왜곡된 성인식, 성차별 문화, 성별 권력을 바탕으로 발생하던 젠더폭력이 이제는 전자 기기를 통해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피해자를 괴롭히고 통제하며 학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범죄가 탄생한 게 아니라, 존재하던 폭력이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어디든 갈 수 있게 날개를 단 것이다.
이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딥페이크 범죄 등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젠더폭력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게 됐다. 언론과 사회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신종범죄’란 이름을 붙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움’으로 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폭력의 전통성, 뿌리 깊음을 돌아보는 일이다. 뿌리 깊은 젠더폭력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지렛대를 타고 사회 곳곳을 넘나드는 일로 봐야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젠더폭력의 맥락과 뿌리가 보인다. 그래야만 기술의 발전 앞에 또 다시 누가, 왜, 어떻게, 더 취약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 ‘아주 오래된 신종 범죄’를 대해야, 범죄의 뿌리를 끊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조혜민
경찰대 박사과정 수료
前 정의당 대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폭력대응지원사업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