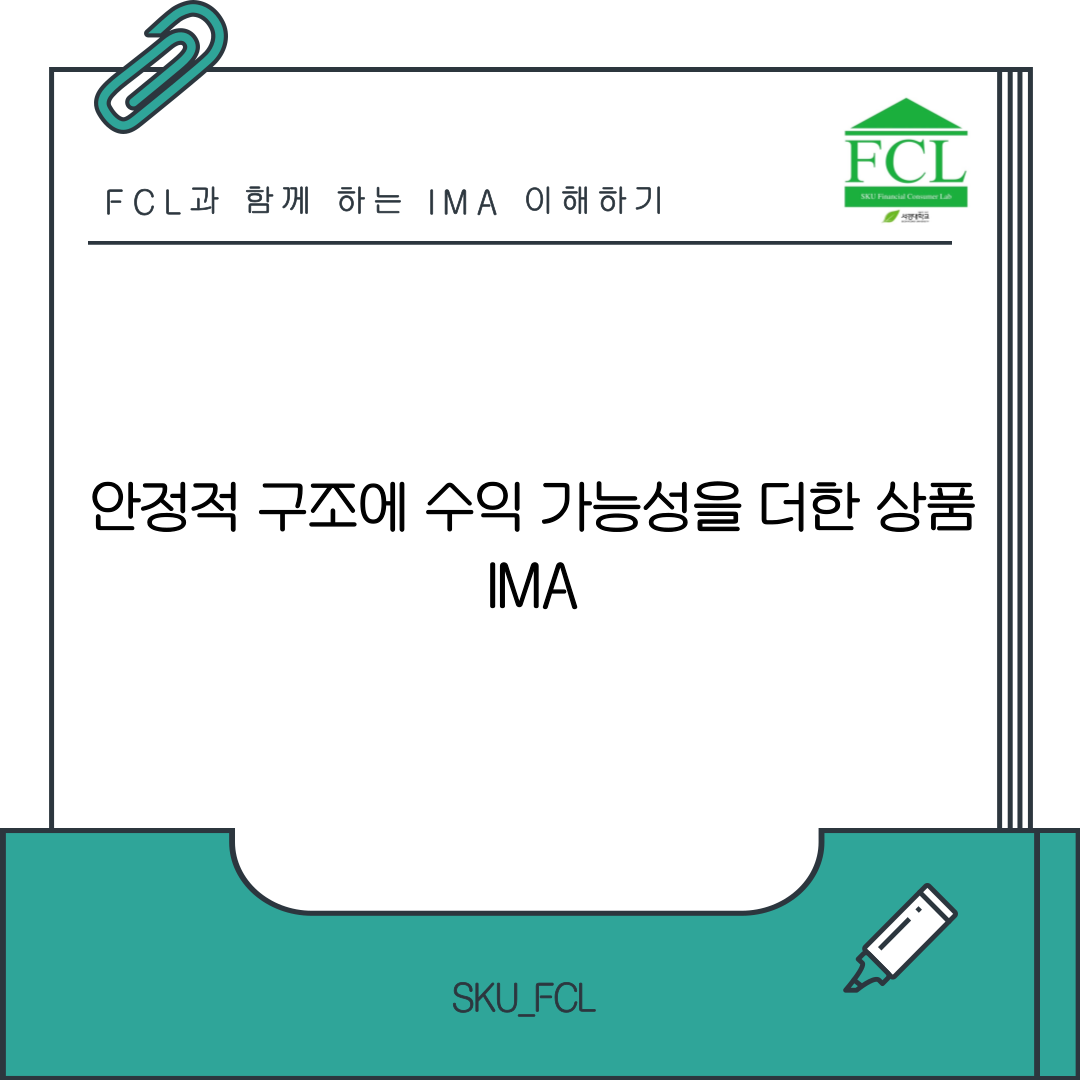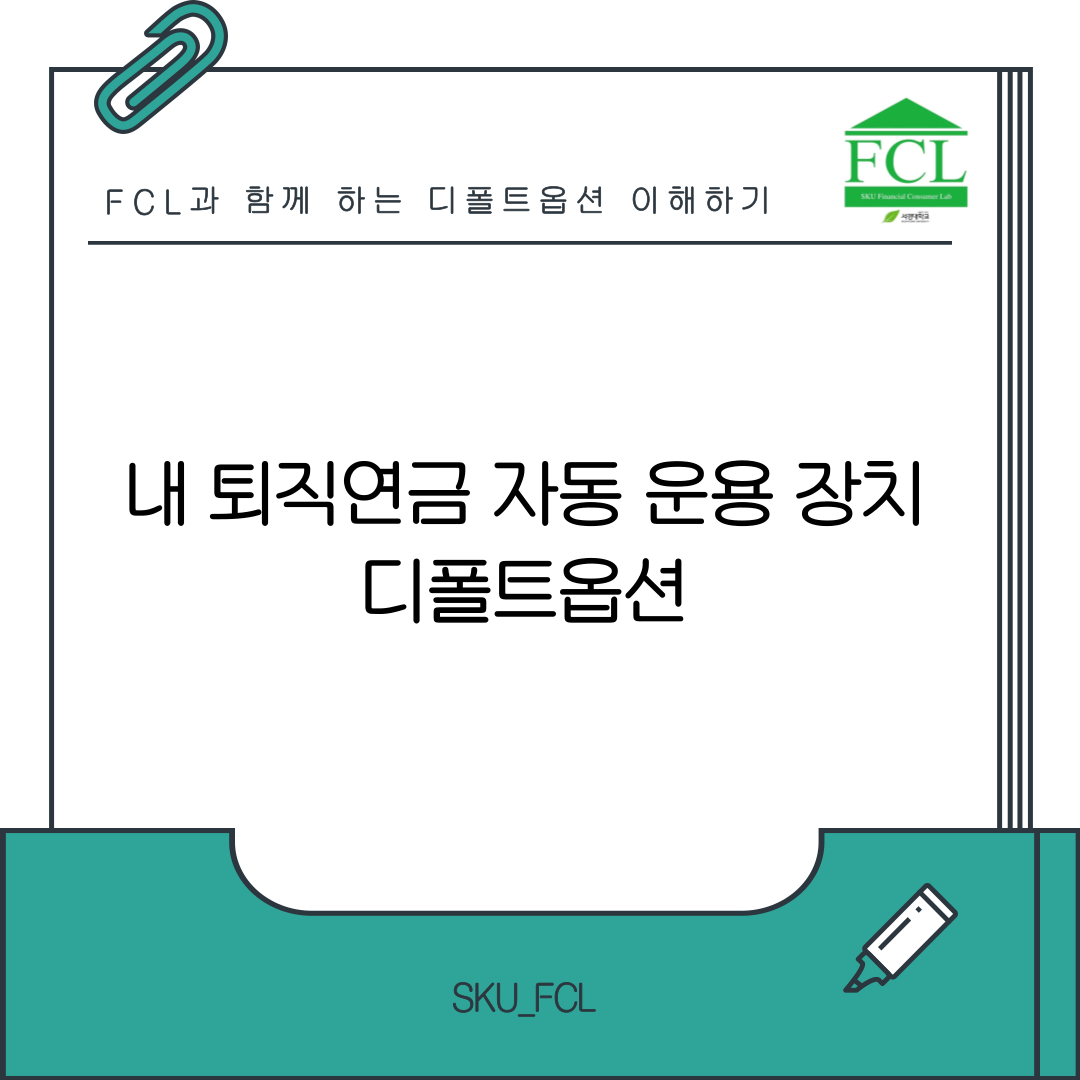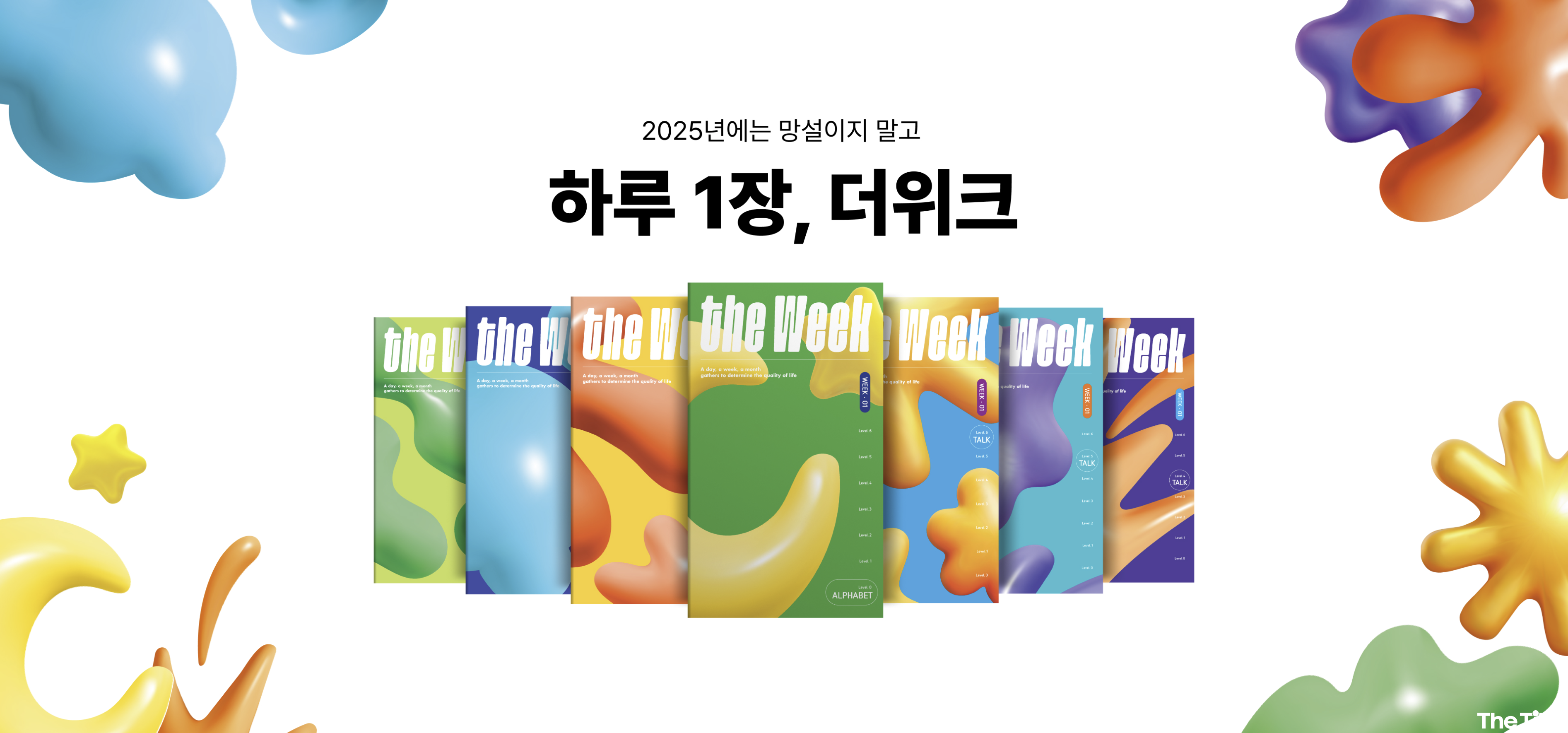AI 평생교육이 전 세계적 화두다. 인구소멸에 시달리는 지방대는 물론 예산 확보가 필요한 유명 대학까지 AI를 활용해 대학에서 비학위 평생교육 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진다. 이런 흐름은 이미 예측된 바 있다. 대선 당시부터 교육 분야 정책관이 다른 여러 후보들 사이 공통적으로 존재했던 게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다. 성인들의 자기계발과 커뮤니티 확산 욕구가 커지면서 운영이 어렵다고 알려졌던 ‘클래스 101’ 등 플랫폼은 물론 특정 주제에 집중한 교육 플랫폼들의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는 뉴스도 이어진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지 오래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사업이나 평생직업교육 고도화(HiVE)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흐름은 아니다. 국내 교육 뉴스에선 아직 크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전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한 평생교육 확산과 그 과정에서 대학과의 결합은 이미 ‘대세’가 됐다. 세계적 명문대인 미국 메사추세츠 공대(MIT)도 AI를 활용한 비학위 평생교육 과정인 ‘MIT Learn’을 오픈했다. 하버드 등 기타 명문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다. ‘개인화’다. AI를 활용해 개인의 평생교육 수요에 맞춘 학습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개인화를 넘어 ‘초개인화’를 내거는 곳도 있다. 대부분 생존이 절실할수록 개인화와 AI활용에 대한 수식어의 강도도 세진다. 그만큼 AI를 활용한 평생교육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여기엔 빠진 게 있다. 기술로 인한 초개인화가 아니라 대학이 장기적으로 지역과 어떻게 공생하고, 지식의 허브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허브’로 거듭날지 하는 고민이다. 전세계적으로 대학을 통한 지역재생 성공사례를 보유한 나라 중, 획기적인 기술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없다.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되, 개별 지역이 보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퍼스를 열었다는 공통점만 있다. 여기서 캠퍼스는 대학이 보유한 무형의 자원뿐 아니라 물리적 공간도 포함한다.
대표적인 곳이 일본 요코하마시립대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겪어온 일본은 대학을 지역문제 해결의 요람으로 삼는 ‘COC(Center of Community)’ 사업을 운영해왔는데,그 모범사례로 꼽히는 곳이 요코하마시립대다. 요코하마시는 수도 도쿄에 근접한 지역이지만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늙은 동네’다. 요코하마 시립대는 ‘전 연령층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일단 가장 큰 인구 수를 자랑(?)하는 노인들의 복지에 맞춰 병원과 함께 의료 세미나를 열고 대학 캠퍼스뿐 아니라 시내 낙후지역 곳곳에 시민들을 위한 놀이 시설을 만들기도 했다. 시립대는 교수들, 학생들이 나서 세미나나 포럼을 운영하거나 평생교육 과정에 준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을 ‘지역의 니즈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꼽는다.
또 다른 예도 있다. 미국 예일대는 도시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박물관 호텔, 기차역 등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대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국립 대만대학교와 국립 대만 예술대학교는 대만의 만리, 진산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과 협력해 지속가능 관광 자원을 개발했다.
이쯤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15년 전부터 사라지기 시작한 모습이 있다. 바로 대학 식당에서 밥을 먹고, 대학 공간을 즐기는 지역 주민들이다. 주로 형편이 썩 좋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나 노인들이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기다 시간을 보내기 무료한 노인들은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세미나에 ‘밥도 먹을 겸’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학에선 밤마다 운동 삼아 캠퍼스를 도는 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당시엔 이들을 ‘지역 주민’이라 불렀는데, 이제는 그 이름은 사라진지 오래다. 지금 그들은 ‘외부인’이라 불린다. ‘학생 식당은 학생을 위한 서비스’라며 학생증을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고, 젊은 학생이거나 교수가 아닌 듯한 모습으로 캠퍼스를 배회하면 ‘외부인’이라며 민원 대상이 된다.
대학이 지역과 함께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개인화가 아니라 공동체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초개인화 AI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일부의 방법 중 하나이지 대학과 지역의 나아갈 길은 아니다. 모든 성공한 대학과 지역의 공동 재생 사례에는 개인이나 기술이 아닌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지역 주민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캠퍼스가 지역을 살리는 거점이 될리는 만무하다.
AI 교과서가 시기상조라며 교과서에서 보조 교재로 지위를 박탈하며 수많은 에듀테크 업체들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처럼, 밑그림과 철학의 전면적 검토 없이 기술에 의존한 대학과 지역 살리기는 실패할 공산이 크다. 목표를 먼저 말하면서 ‘깃발 꼿기’로 성과를 얻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지역사회 모두가 진다. 초개인화가 아니라 ‘초공동체화’를 먼저 고민할 때다. 대학 판 ‘AI 교과서 폭탄 돌리기’가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