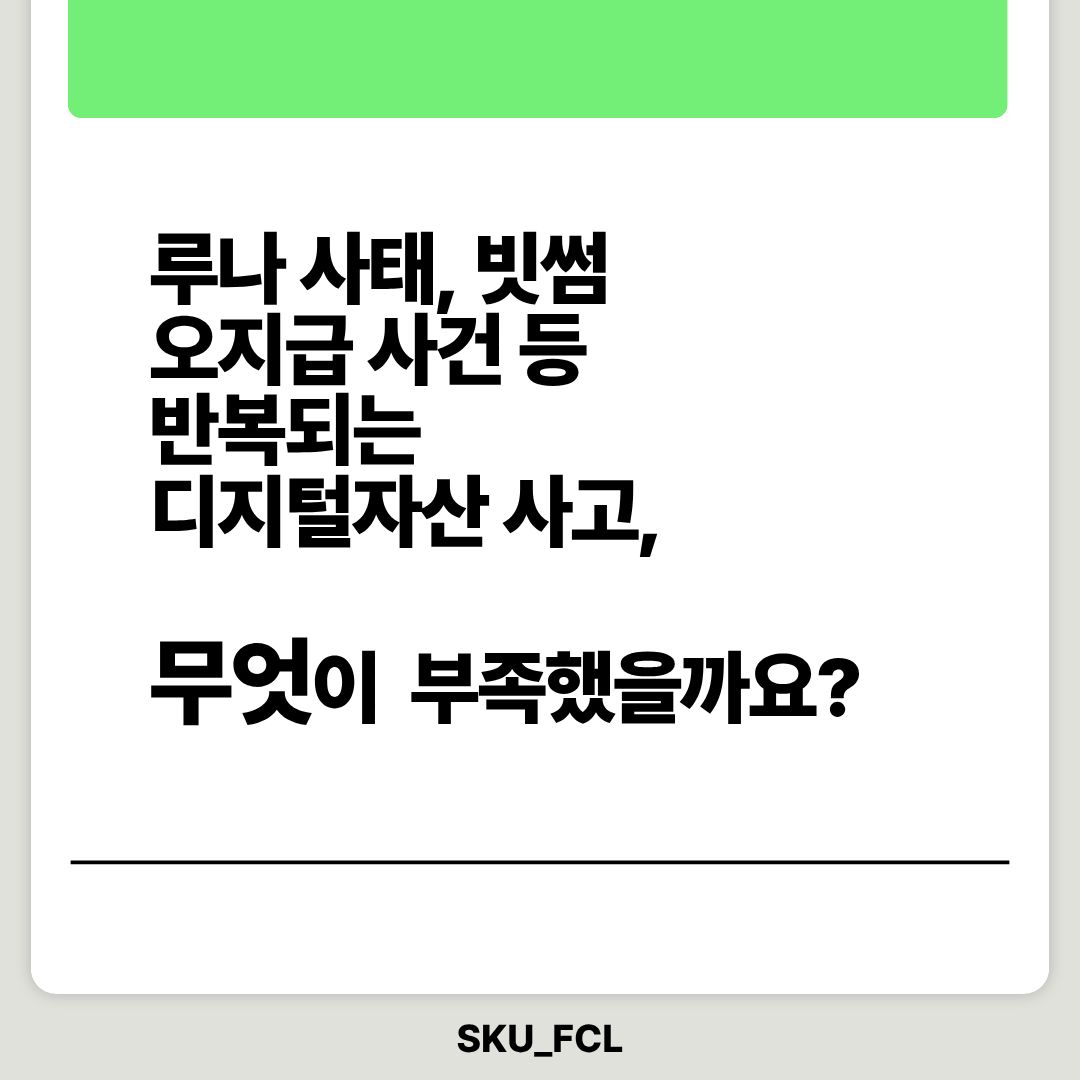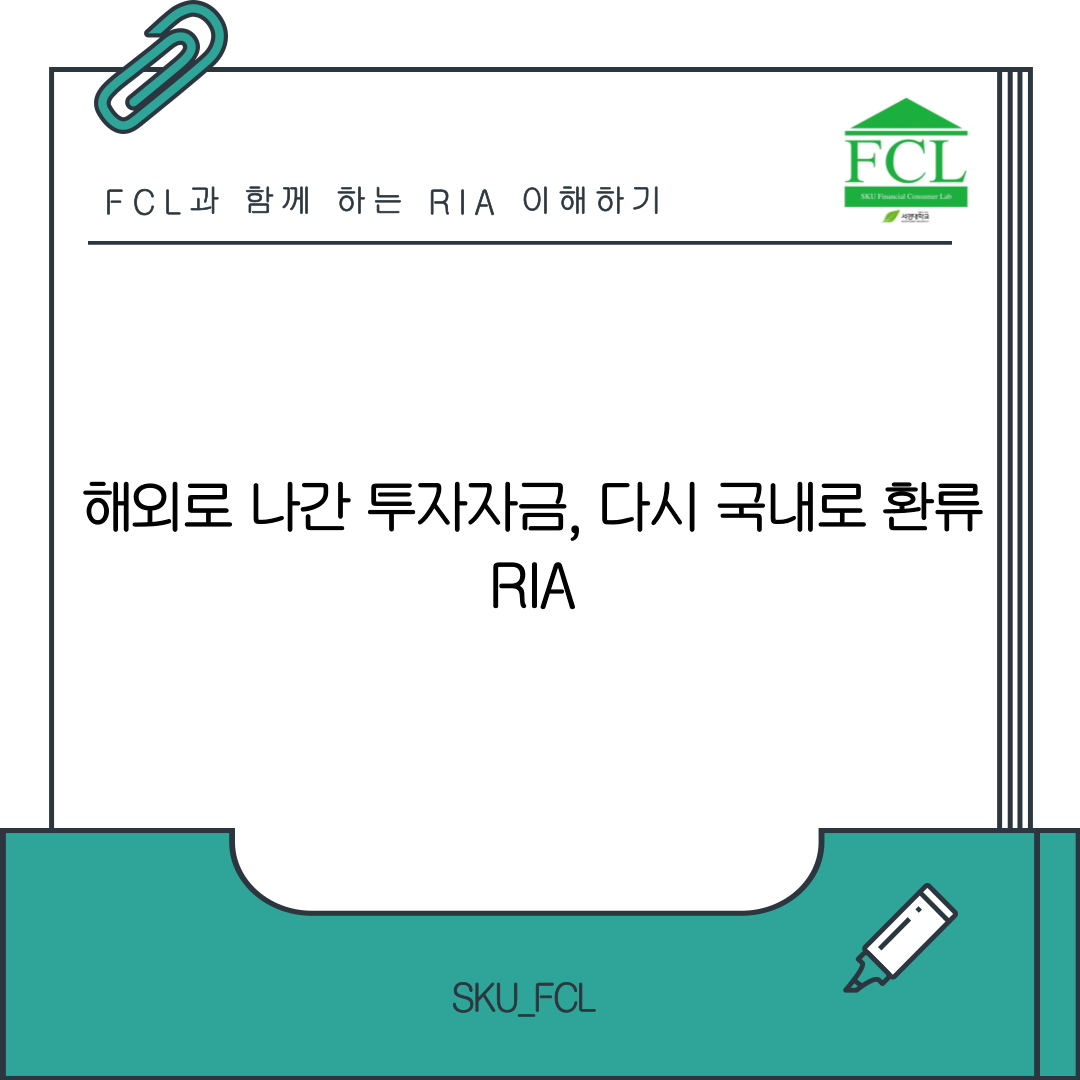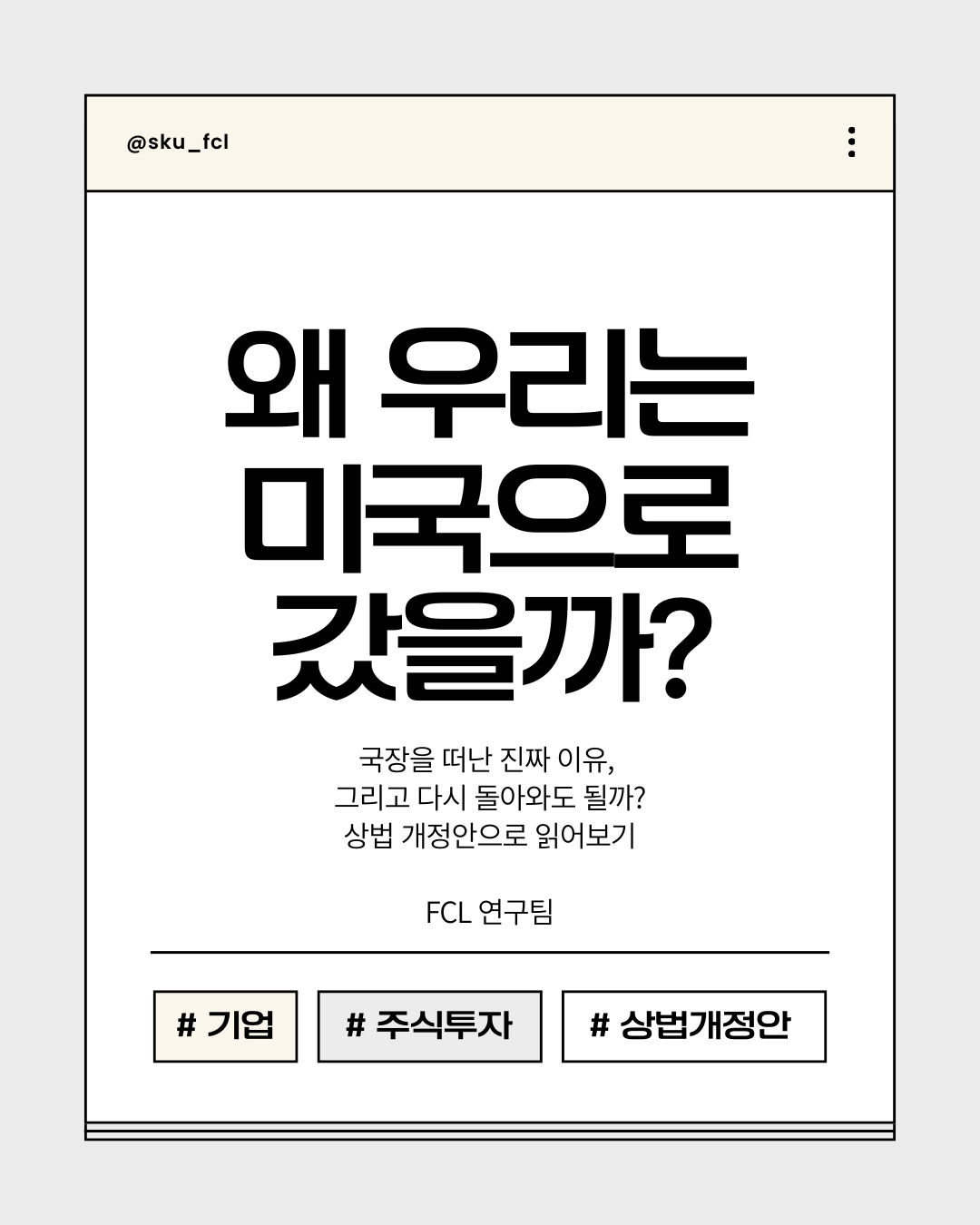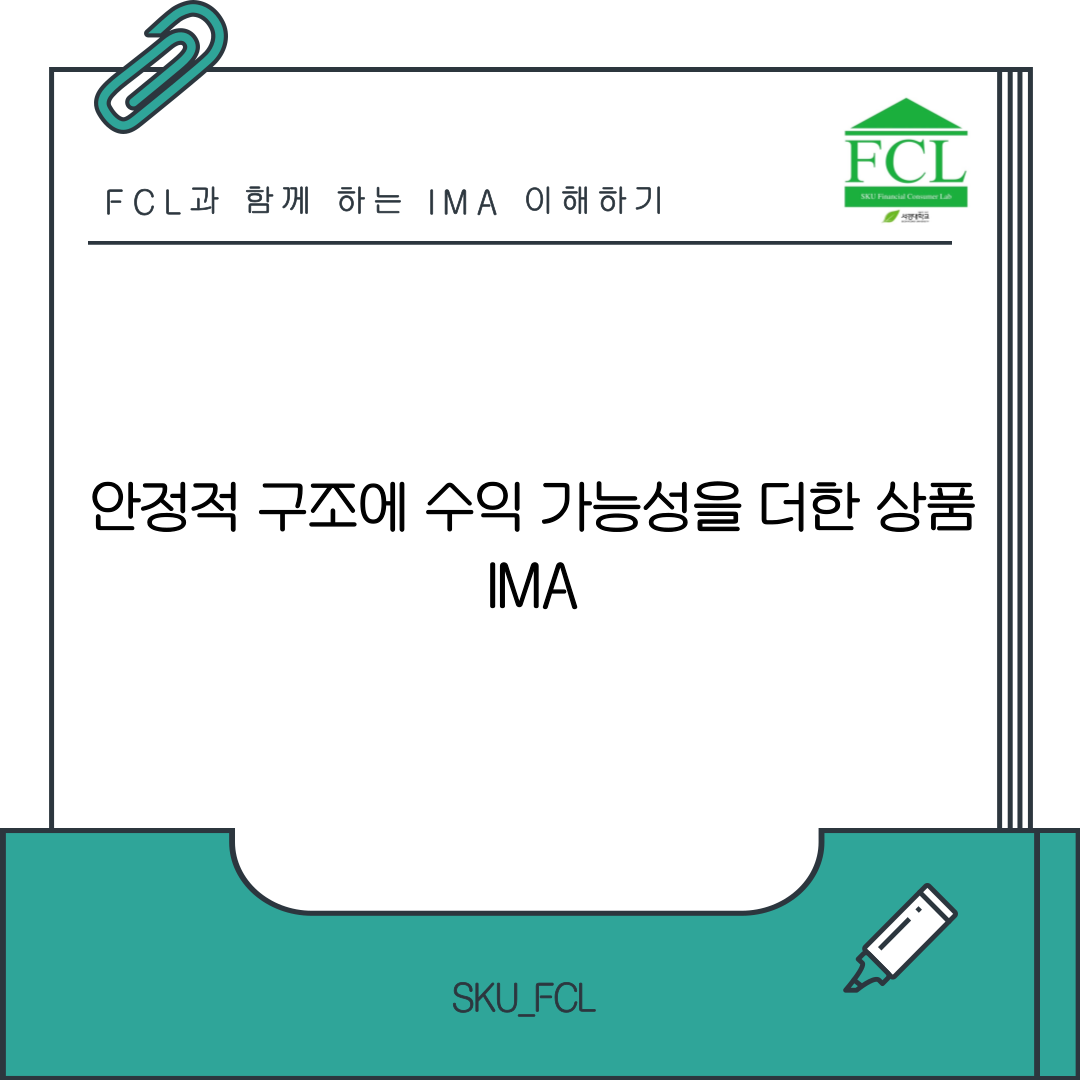뉴스 속 너무 먼 시사상식 자연스럽게 아는 척 하고 싶다면? ‘시사상식 벼락치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시사상식 핵심만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 조별과제’ 라고도 불린다. 한 국가의 힘으론 해결할 수 없고,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년 이맘때면 이 과제를 위한 가장 큰 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가 열린다. 지난 11월 11일 29번째를 맞는 총회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됐다. 이번 총회의 화두는 단연 ‘돈’. 전 세계 198개국이 모인 COP29에선 기후위기 대응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누가 얼마나 분담할지를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각 국가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크게는 비용 부담이 큰 선진국과 이를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대립으로 갈렸다. 기후 문제 해결에 드는 돈, 누가 낼 것인가. 이른바 ‘기후재원’을 두고 벌인 팽팽한 줄다리기 현장, 2024 COP29를 돌아봤다. 3분 투자해서 2024 COP29 한번에 파악해보자.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후 부담 청구서’ 만들기
국제사회는 과거 경제 발전을 위해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선진국에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비용 부담의 책임이 있다는 데 뜻을 모아왔다. 기후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16이었다. COP16에서 선진국이 2020년까지 기후재원 연간 1000억달러(약 140조1600억원)를 조성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2025년으로 연기됐다. 때문에 이번 COP29는 2025년 이후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실질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COP29의 핵심 의제도 ‘신규기후재원목표(NCQG)’였을 정도다.
기후재원의 윤곽을 새롭게 잡는 데 있어 관건은 단연 돈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내는가다. 그리고 이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초반 개발도상국 측은 선진국 측에 공공 재원 1조달러(약 1378조6000억원)와 민간 재원 5조달러(약 6892조원), 총 6조달러(약 8355조원)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며 극심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 오염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이 막대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선진국 측은 즉시 무리한 금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선진국 측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비교적 최근에 경제발전을 시작한 나라를 의무 공여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규모에 관한 대립만 이어진 게 아니다. 선진국은 무상 공여, 차관 등 공적 자금뿐 아니라 민간 투자 자금까지 기후재원으로 인정 해줄 것을 주장했는데, 개발도상국은 공공 재원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을 막아섰다. 개발도상국 측은 2022년 기준 선진국들이 연 1159억달러(약 159조8000억원)의 기후재원 조성을 달성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중이었다. 이와 같은 달성이 공식·비공식, 공공·민간 자금을 모두 끌어모은 것이기에 선진국이 온전하게 기후위기에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총회가 진행되며 더욱 격렬해진 양 측의 갈등은 합의문이 공식 발표되자 극에 치달았다. 첫 번째 합의문에 선진국이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정확한 금액조차 기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응해 수정된 두 번째 합의문에서도 2035년까지 선진국이 단 2500억달러(약 351조3750억원)만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측이 요구한 금액의 4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양측 대립이 격화하면서 현장에 있던 기후위기에 취약한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최빈국연합(LDC) 대표자들은 도중에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예정한 폐막 시간이 30시간이 지나고서야 나온 합의문엔 개발도상국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이 우세하다. 매년 모금할 기후재원 규모는 3000억달러(약 421조6500억원)로 선진국이 당초 내건 2500억달러(약 351조3750억원)에서 소폭 상승했다. 기후재원 조달 방식도 마찬가지다. 민간 투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 측의 뜻이 묵살되며 ‘공공 및 민간 모든 출처에서’라고 명시됐다. 부족한 기후재원 액수와 구체성 없이 끝난 논의에 인도와 시에라리온 대표 등은 강한 비판에 나섰고, 환경 단체 또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올해 COP29 역시 ‘반쪽짜리’ 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파워 게임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했다.
◇ COP29 이후, 한국이 풀어나갈 숙제는?
기후변화협약이 만들어진 1992년을 기준으로 재원 기여국을 선정하는 COP 방침 상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에 공식적 공여 의무는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경제 대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COP29 중 나온 주요 서약에 동참하며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먼저 지난해 COP28에서 123개국이 서명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의 연장선상으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에 동참했다. 이로써 2030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을 6배 확대하고, 2040년까지 전력망 8,000만km를 추가 및 개조하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보다 적어도 30% 이상 줄인다는 내용의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도 선언했다. 반면 아쉬움도 남겼는데,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후행동네트워크(CAN) 선정 ‘오늘의 화석상’ 수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기후 악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을 얻은 것이다. 국제 기후환경단체들이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도 2년 연속 비산유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선 한국이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없다는 점이 큰 감점 요소가 됐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강화된 ‘온실가스감축계획(NDC)’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것이 시급하다. 2015년 프랑스 파리 COP21 합의 사항에 따라, 당장 내년 2월까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이나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 소송 헌법불합치 판결로 2030년 이후엔 상향된 목표치를 내놓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전지로 양측에 상흔만 남긴 COP29.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더 큰 책무를 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란 조별과제에 무임승차하려는 나라가 어디인지, 앞으로의 이슈에도 주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