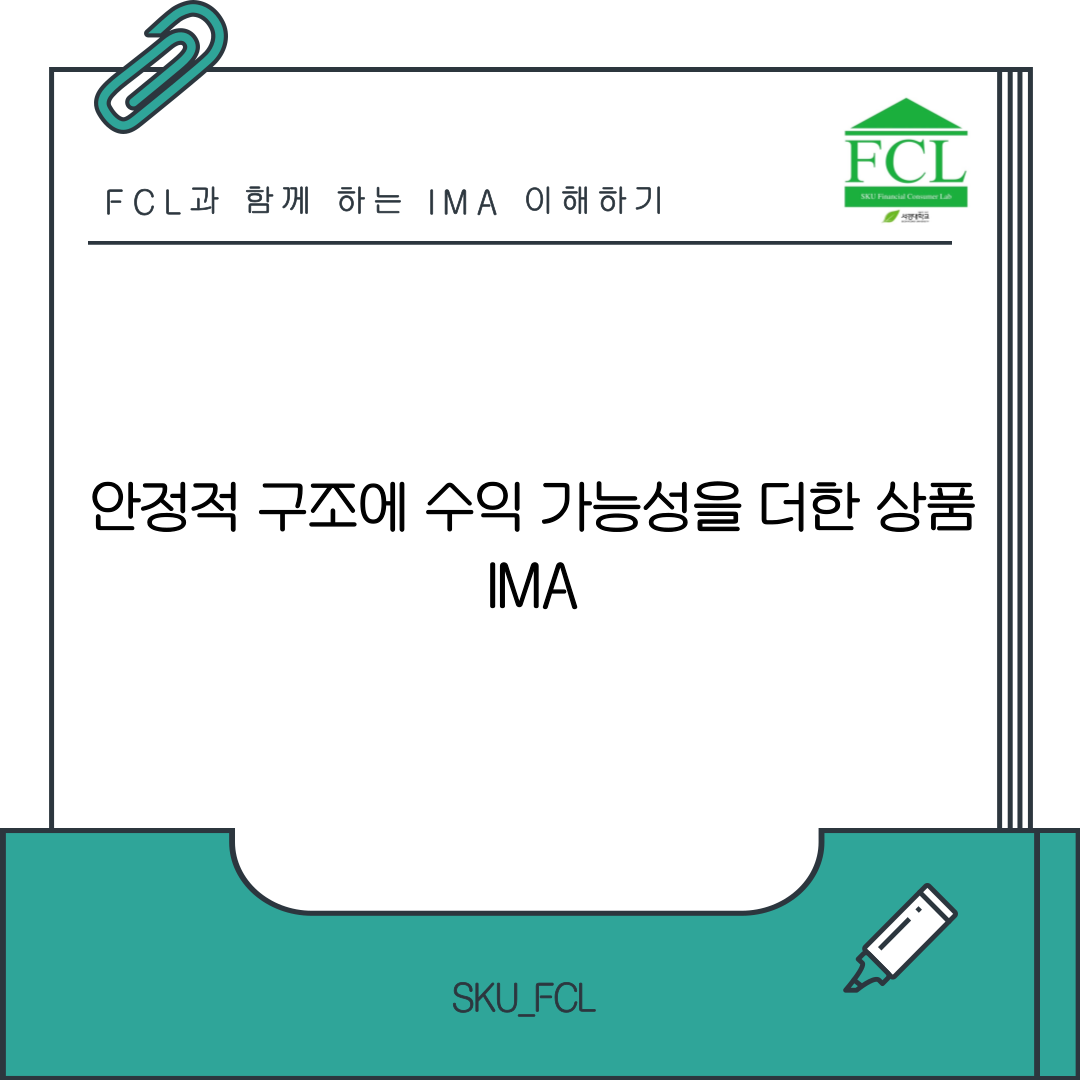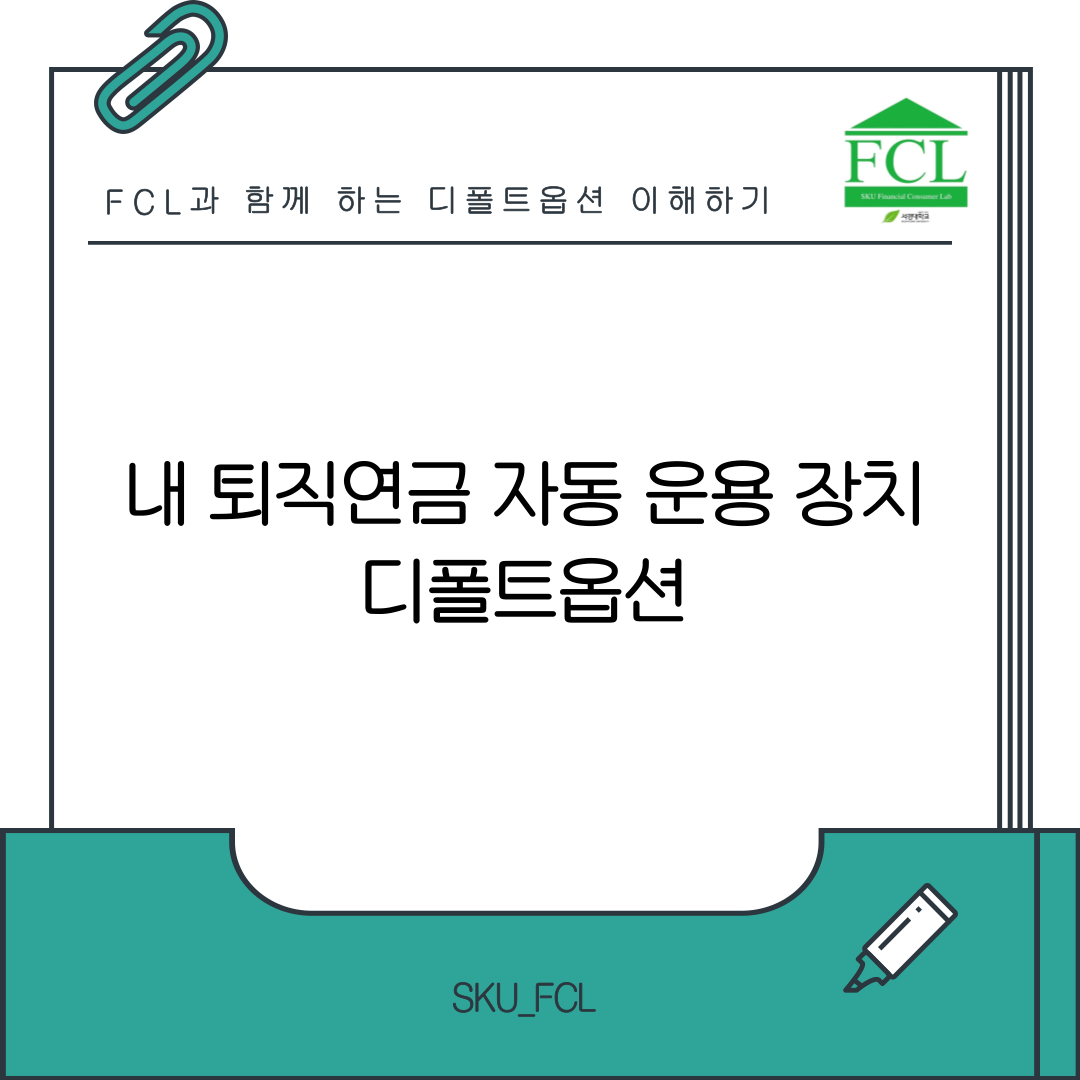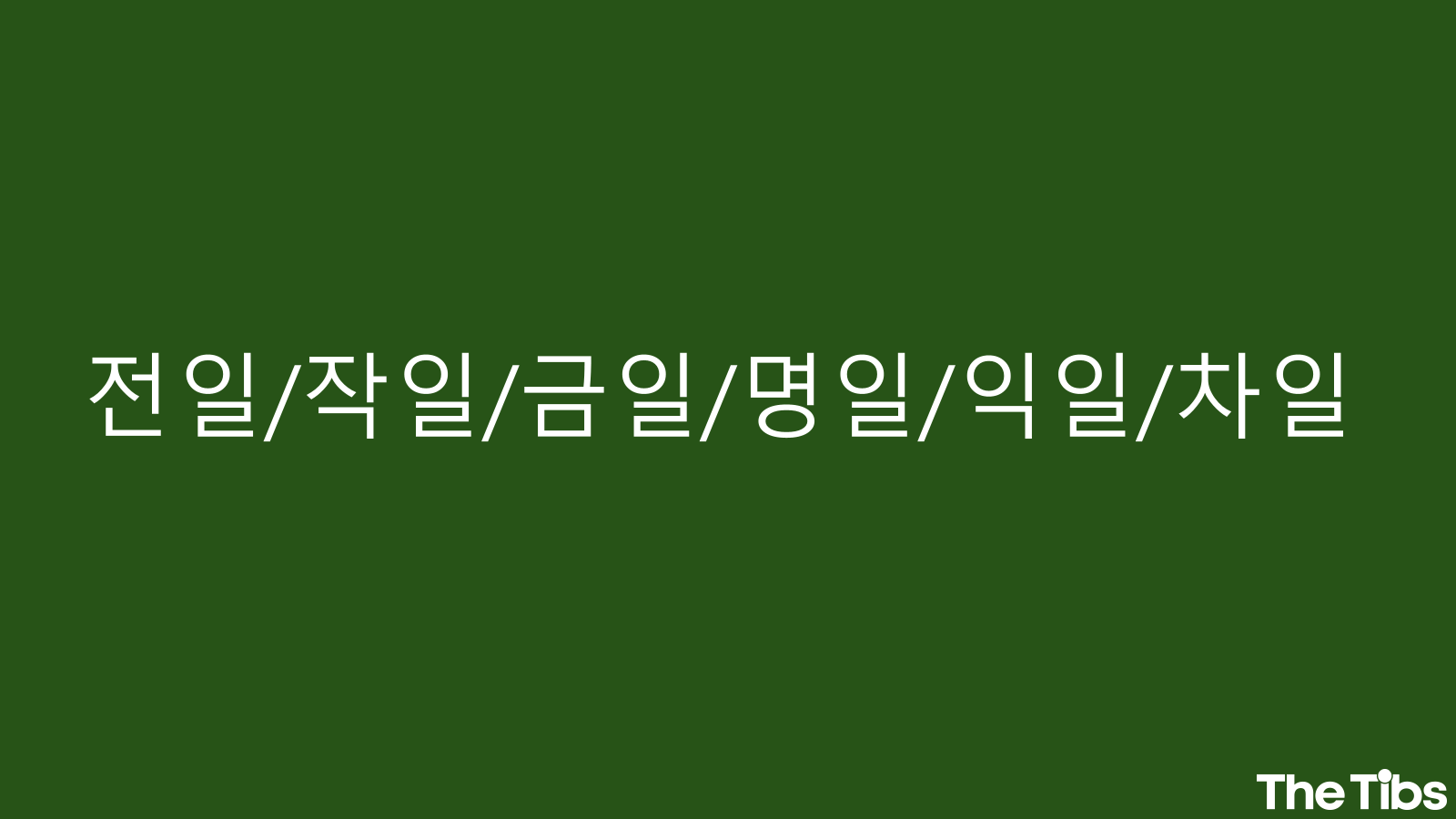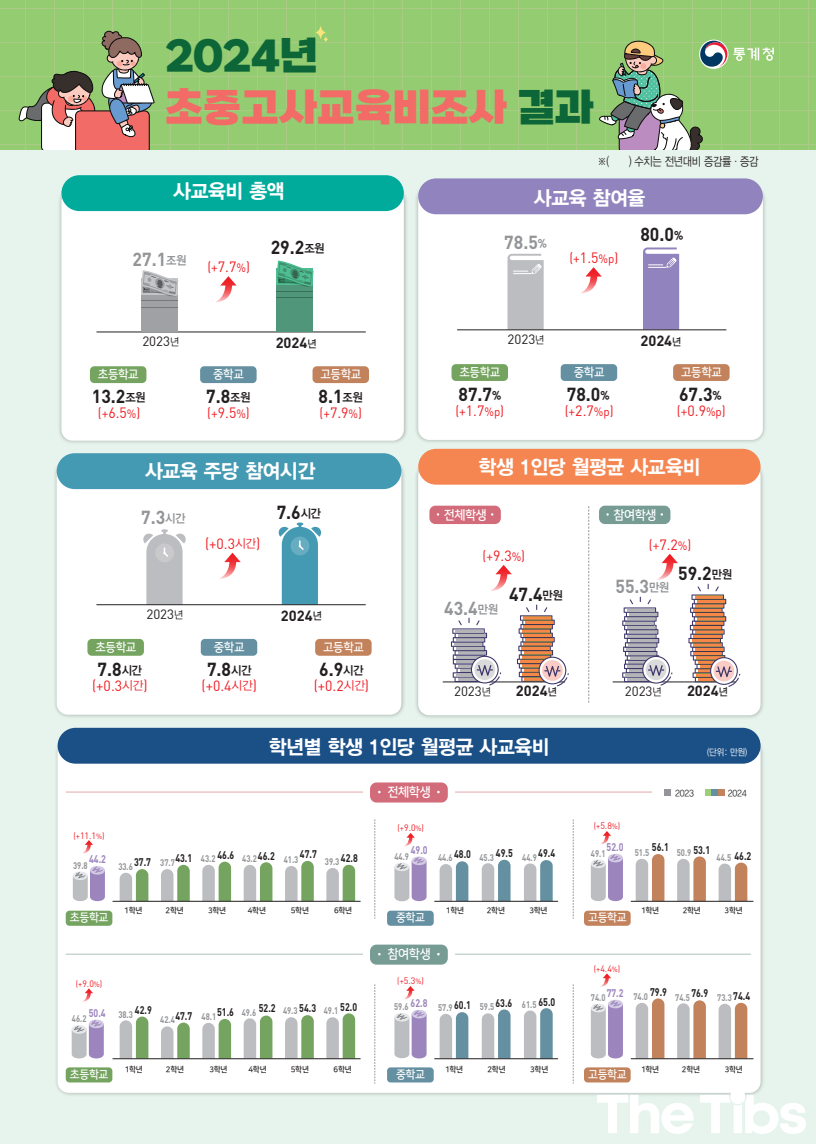잘나가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관리자 A씨. A씨는 요즘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 국내 지방 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까지 종횡무진 중이다. 매 출장마다 명목도 다양하다. 현지 교육 관계자들과의 협의, 교사 교육, 학부모 미팅, 현지 직원 교육….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일을 소화하면서도 A씨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A씨 회사가 내놓은 에듀테크 서비스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A씨는 개발자도 아니다. 잘 만들어진 제품을 보급하기만 하면 될텐데, 영업 담당도 아닌 A씨가 바쁜 이유가 뭘까. 그는 “프로덕트를 만들어 판매한다고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회사 제품은 국내에선 질이 좋아 입소문을 탔고, 해외에선 학교가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든 환경의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높여 각광 받고 있다. 잘 만든 프로덕트라서 잘 팔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A씨의 잦은 출장은 그저 ‘팔기 위한’ 출장이 아니었다.
학교 자체가 부족하거나 인터넷조차 되지 않는 곳에선 기본 시스템 개선을 고민한다. 교사가 학습 내용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교사 교육을 한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당 학습 목표나 과정이 그 나라의 문화나 사회적 관습에 잘 맞는지 살핀다. 여기에 아이들이 학교 자체에 오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마을 상황까지 살펴야 한다. 심할 경우엔 아이들이 생계를 위한 노동 대신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마을 주민 인식이나 경제 상황 개선 프로젝트까지 진행시켜야 한다.
물론, 이는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 애시당초 교사와 학부모 사이 AIDT(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보급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나 공감이 부족했고, 학생의 개별 진도에 맞는 학습이 선행학습을 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를 공교육이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지, 폭넓은 의미에서의 맞춤형 교육을 의미하는지도 따져보지 못했다. 단순한 효율적인 문제 풀이가 목표인지 전인교육이 목표인지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본격적인 대선 가도에 들어서면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이례적으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성에 한 차례 겪은 AIDT 지위 논란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건 왜일까.
AIDT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 효과 향상에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사회 제도를 바꿔낼 준비가 됐는가 하는 질문이 중요한 때라는 의미다. 물량공세나 빠른 추진이 좋은 교육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교훈은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비싸게 치렀다.
“에듀테크 프로덕트의 존재 목적은 학습자의 교육적 효과다. 좋은 프로덕트는 그 과정 중 하나다. 프로덕트가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민과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도 A씨는 국내외 곳곳의 교육 현장을 간다. 교육 정책을 만드는 이들은 A씨만큼 현장을 알까. 아니, 그 필요조차 알까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