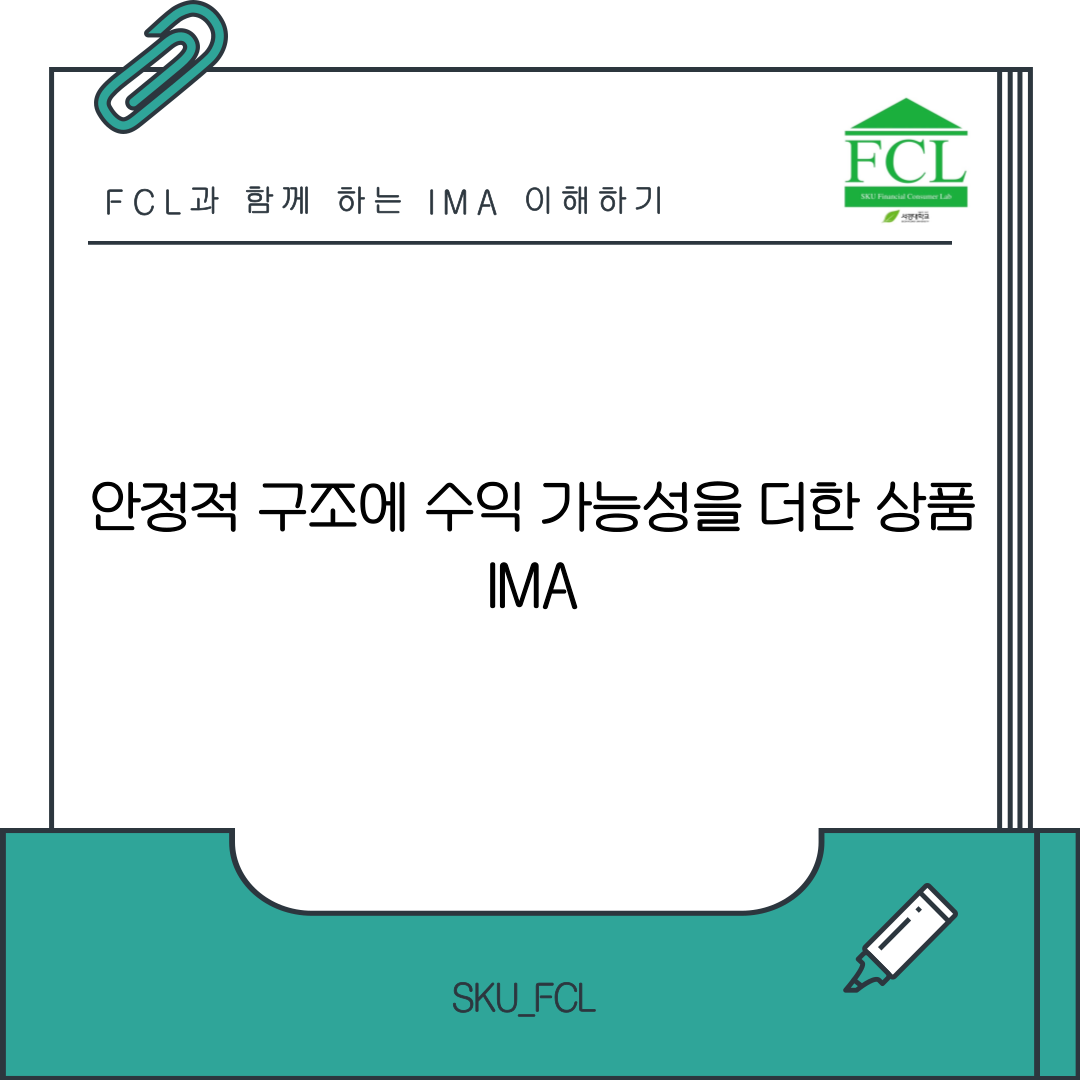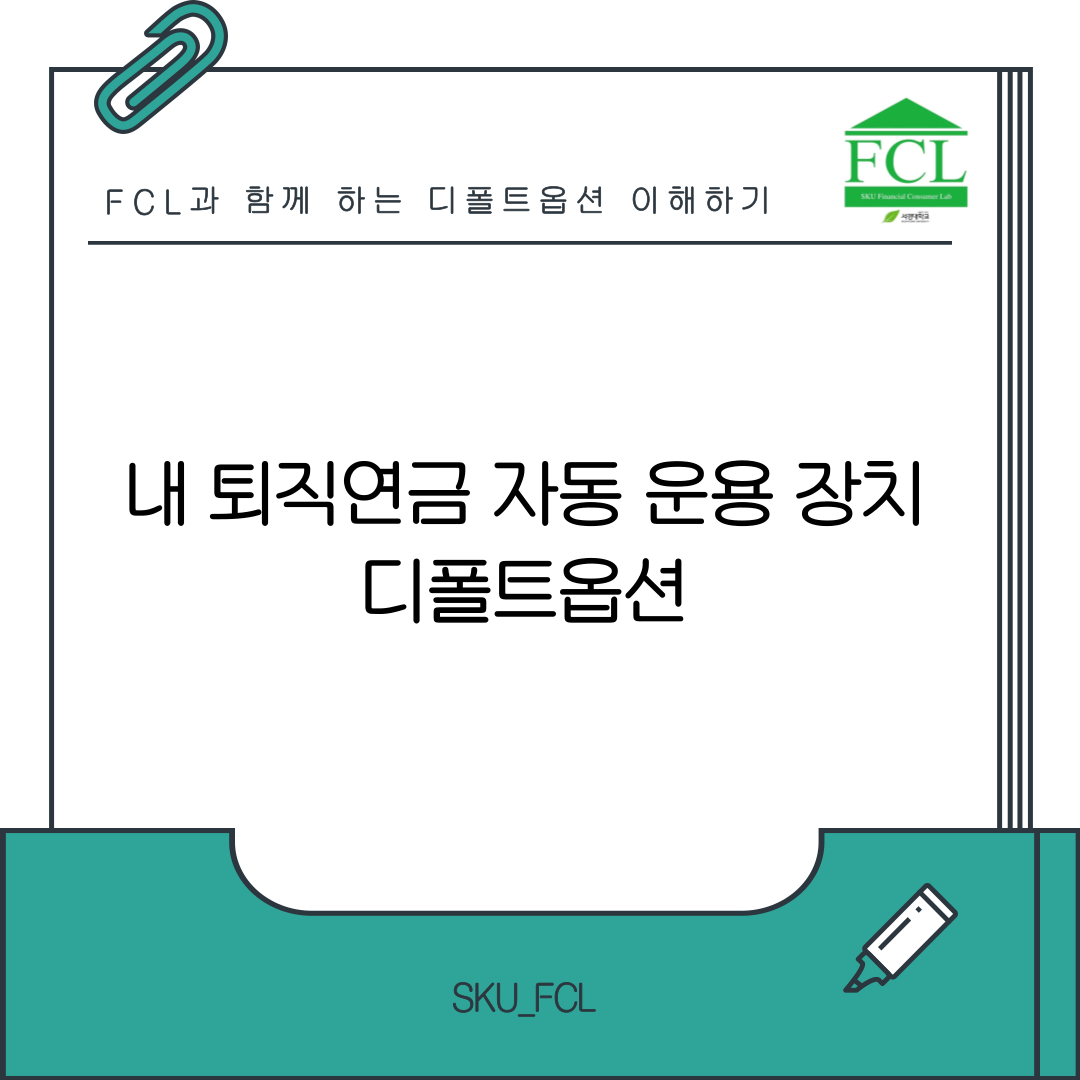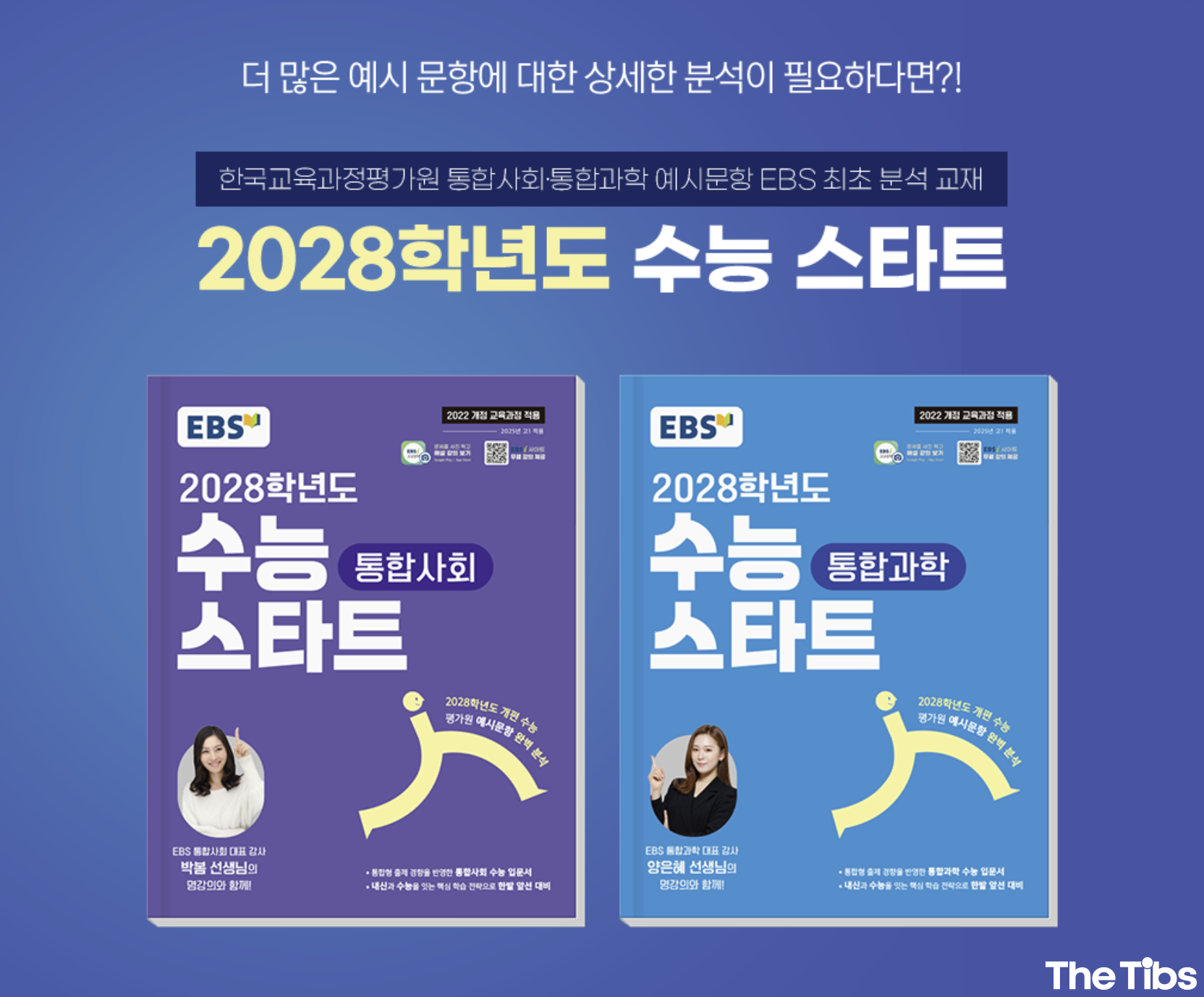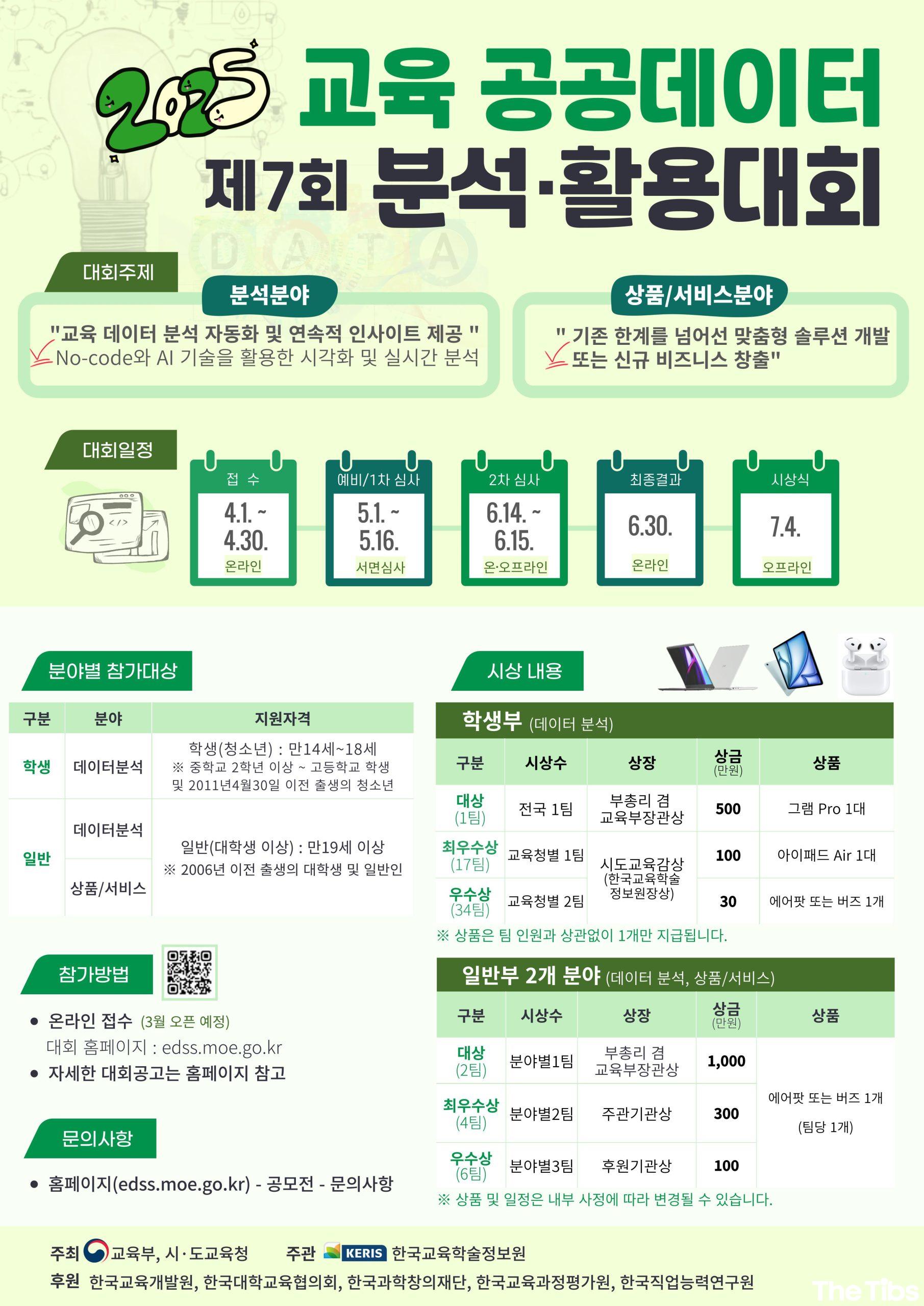오늘(9일) OECD 보고서 <한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 2025>가 공개됐다. 한눈에 보는 교육은 OECD가 펴내는 교육 분야 연례 보고서로, 전 세계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한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40개국의 데이터를 수집·비교해 교육 시스템의 규모, 구조, 성과, 재정, 교사 관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에,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 정책 입안자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500쪽에 육박하는 영문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살펴봤다. 지난해 “문해력과 기본 교육 역량이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면서 “교육의 형평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OECD가 올해는 어떤 진단을 내렸을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점은 올해 보고서에서 OECD가 ‘평생교육’을 유난히 강조했다는 점이다. 취업 후 사회나 기술 변화에 맞춘 지속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나, 은퇴자들을 위해 이른바 ‘인생2모작’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평생교육과는 그 강조 지점이 달랐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지적한 ‘문해력의 격차’가 어디서 나타나는지에 주목했는데, 주된 이유가 저학력 집단에서의 문해력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그 이유로 짚었다. 즉, 전체 성인들의 문해력이 눈에 띄게 하락했는데 그를 만든 이유 대부분이 교육을 덜 받은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당연히 해당 집단은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도 고학력 집단에 비해 떨어진다.
여기에 OECD는 또 다른 지점도 짚었다. 고등 교육에 있어서 중도이탈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각종 이유로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 역시 사회, 경제적 불안정성에 기인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OECD가 평생교육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양한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중도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에 정규 교육 밖의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즉, 이제 더 이상 학교 안의 교육으로는 교육이 세상에 해야 하는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 세상 속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 보고서를 읽으며 또 다른 격차를 생각했다. 이미 돌아보면 세상 속 평생교육은 많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교육이나, 비싼 비용을 치르고도 가는 사적인 공간도 있다. 비단 흔히 생각하는 교육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나무 이름 외우기, 제철 음식 만들기, 차 공부, 요가나 명상… 주변에선 다양한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발적인 ‘평생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사람들 대부분이 어느정도 자본과 학력, 네트워크 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지적 자극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더욱 평생교육에 적극적이다. 여기에 이를 함께할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도 가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관련한 기사들을 보면 늘 나오는 말이 있다. “있는 제도도 몰라서 못 사용하는 게 가장 취약한 상황의 사람들이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평생교육 설계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닿을 수 있는 평생교육을 구성하는 게 아닐까. 물론 그걸 정부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취향과 관심사를 서로 발견하도록 하는 다양한 공동체, 교육과 공부에 대한 목마름을 느낄 ‘여유’가 있도록 기본적 삶의 안정성 보장.
평생교육 필요한 사회, OECD의 진단은 결국 또 ‘불평등 해소’를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