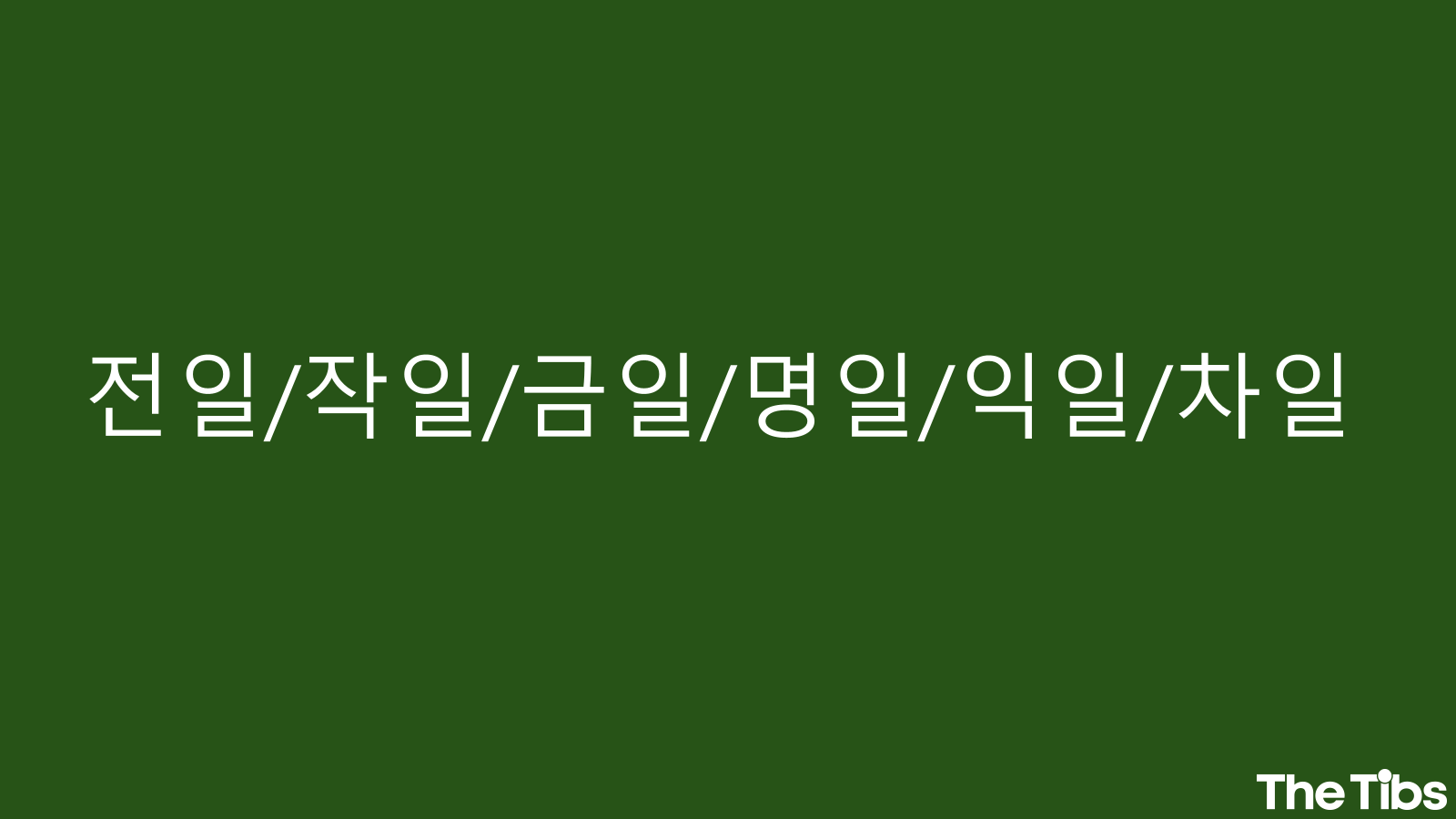지난해부터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AI 교과서 도입도 ‘화이부실’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스럽단 목소리가 높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성토의 목소리가 비단 AI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AI 교과서 도입을 찬성하거나 심지어 제작에 나선 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AI 교과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찬반을 떠나 정부가 교과서 문제를 ‘졸속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셈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줄 변화를 만들면서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의 방향성과 철학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 제도를 바꿀 땐 제도에 대한 논의에 앞서 ‘어떠한 교육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교육관과 철학에 대한 고민이 밑바탕에 튼튼히 뿌리내려야 함에도, 우리 정부는 디지털 교육이 ‘대세’라며 도입에만 나서 우왕좌왕하는 모양새 때문이다.
정부가 AI 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자주 활용하는 일본 사례를 보자. 정부는 이웃나라이자 우리나라의 오랜 숙적인 일본이 2030년까지 AI 교과서의 전면적 도입을 선언했고, 그에 비해 우리는 한참 뒤쳐져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며 소리를 높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교육 전환은 그리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디지털 교육을 대하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태도가 천지차이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2030년까지 AI 교과서 전면 도입’ ‘모든 학생에게 1대의 기기를’ 등의 정책은 우리나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오랜 기간 정부가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성을 따져왔다. 이 과정에서 추진 방법에 대해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 콘텐츠 개발자, 교육 전문가 등과 면밀한 논의를 거쳐온 것은 물론이다.
일본의 디지털 교육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이때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 혁신을 추진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2019년부터 ‘기가스쿨(GIGA SCHOOL)구상’이라는 정책을 도입해왔다. 기가스쿨은 국내에 단순히 ‘디지털 학습으로의 전환’으로만 알려져있지만, 그보다 깊은 교육적 고민을 담고 있다. 애초에 기가스쿨구상의 ‘기가’라는 단어가 ‘모두를 위한 글로벌, 혁신 교육을 위한 관문(Global and Innovation Gateway for All)’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훨씬 넓고 도서산간지역이 많은 섬나라 일본에서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을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교보재 개발을 비롯 인터넷 등 디지털 교육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디지털 단말기의 규격부터 도입에 대한 토론,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전면적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총 예산은 약 2조원(2292억엔)에 달한다.
비슷한 디지털 교육 전환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다. 에스토니아는 구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작은 국토 면적과 적은 인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디지털화에 사활을 걸었고, 2000년이 채 오기 전부터 디지털 교육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약 30여년의 기간 동안 디지털 교육 콘텐츠 자체와 제반 제도를 다듬어온 에스토니아와 1년 안에 도입 논의부터 교육 현장 실사용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진행되는 국내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기에 시급하게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도입했다 ‘후퇴’를 결정한 나라들도 많다. 심지어 대부분 북유럽 선진국들이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에 최근 캐나다까지 이 대열에 들어섰다. 이 나라들은 당초 계획과 달리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중 기기를 활용해 딴 짓을 하는 학생이 늘어나거나,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나 대화를 통한 지적, 감정적 자극이 현저히 줄어들어 교육적 효과가 지극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물론 일본과 한국의 교육 현장이나 제도적 배경이 다르듯 이들 나라와의 단순 비교 역시 부적절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교육 환경과 결과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을 철저히 따져보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의 나아갈 비전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기의 도입 여부, 방식, 그를 실제로 움직일 제도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공적 차원의 고민조차 없이 개별 사기업을 통해 도입한다는 게 문제다.
‘인강 공화국’이면서 일본 못지 않은 급속한 지역소멸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보통신 기기와 AI를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학습이 큰 교육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보기에 화려한 디지털 기기나 콘텐츠를 교실 안에 빠르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육의 비전에 견주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할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다.
다시, ‘화이부실’로 돌아가자. 양처보의 당당한 풍모와 높은 기개에 반해 그를 따르겠노라 고향을 저버렸던 많은 이들에게 내실 없이 속이 텅 빈 양처보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 그리 오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해온 디지털 교과서가 잡음 없이 교육 현장에 안착해 꽃을 피우고, 우리나라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기원한다. 내실 없는 겉치장만큼 허무한 게 또 있을까. 디지털 기술이란 겉치장에 집중하기보다, 교육의 나아갈 길 모색이란 내실이 먼저 튼튼한지 돌아볼 때다.
더팁스 편집국